- Special Issue 02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유전자치료
DNA-mRNA-단백질의 축이 무너지면 질병이 되고, 이를 수복하는 처치 과정이 치료에 해당한다. 기존의 치료법이 단백질을 대상으로 하는 합성신약, 항체, 재조합 단백질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siRNA, ASO 기반의 핵산 치료제를 거쳐 유전자치료 시대로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치료법이 없던 희귀질환이나 암과 같은 난치질환에 대해 탁월한 효과를 보이면서 차세대 혁신 신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몇몇 승인 사례를 통해 접하고 있으며, 향후 유전자치료제가 미충족 의료를 채워줄 주요 치료 모달리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각 유전자치료 주요 모달리티의 특징과 동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표 1 참조).

유전자치료의 정의와 기술적 분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조에서 ‘유전자치료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유전자치료는 기술적으로 세 분야로 구분된다. 바로 (1)기능적 유전자를 전달하여 결여된 유전자 기능을 수복하는 유전자 전달 치료제(Gene Delivery Therapy) (2)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기술인 유전자 편집 치료제(Gene Editing Therapy) (3)다양한 방식으로 유전자의 변형을 꾀한 세포를 인체에 주입하는 방식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Gene-modified Cell Therapy)의 세 분야다.
다만, 최근 상업화에 성공을 거둔 겸상적혈구 빈혈증 및 지중해성 빈혈증의 치료제인 ‘카스게비(Casgevy)’의 경우와 같이 구분이 모호한 치료제의 영역이 있다. 우선 카스게비는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최초의 유전자 편집 치료제로 여겨진다. 동시에,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지 않고 인체 외에서 유전자 변형이 가해진 조혈모세포를 인체에 전달하여 치료하므로 유전자세포 치료제로 분류되기도 한다. 규제적 관점에서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로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할 의무도 지게 된다.
유전자치료가 갖는 다른 치료법과의 차별성
대부분의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제는 부재한 가운데, 소수의 열성 유전질환에서 유전자의 기능 상실을 단백질 보충을 통해 치료한 사례가 있다. 혈우병 치료를 위한 혈액응고인자나 고셔병 치료제인 세레자임(Cerezyme)이 그 예다. 이들은 별도의 전달체가 필요하지 않거나 당엔지니어링(Glycan Engineering) 기법만으로도 세포 내 전달이 가능했다. 하지만 단백질 제재는 좋지 못한 약동학적 성질로 빈번한 주사가 필요하고, 정맥주사만으로는 세포 내로 전달이 어렵다. 그 후 개발된 siRNA나 ASO 기반 핵산 치료제의 치료적 접근은 지질 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 LNP)의 개발을 통해 가능해졌다. 하지만 주로 간 전달에 국한된다는 점, 지속적인 투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반복 투여에 기인한 높은 가격 및 안전성의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 치료’로서 유전자치료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다른 치료법에 비해 유전자치료제가 갖는 장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회 투여로 거의 영구적인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AAV(Adeno-Associated Virus; 아데노연관바이러스)와 같은 효율적인 전달체를 통해 다양한 조직으로 치료 영역이 확대되었다. 셋째, 근본적으로 개인맞춤형 치료에 기반을 두고 있어 전달체가 갖는 독성 외에는 그 자체로 커다란 독성이 유발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유전자치료제가 표적 하는 질환 자체가 대부분 희귀질환이므로 신속심사나 희귀의약품 지정 등을 통한 개발·허가 기간 단축 등 개발자들에게 유인책이 존재한다.
유전자치료제 개발 동향
1) 유전자 전달 치료제
유전자 전달 치료법은 초기에 시도되었던 아데노바이러스와 레트로바이러스의 안전성 문제로 1990년 이후 암흑기를 맞았다. 그러나 AAV라는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달체를 채택하여 부활하게 된다. AAV는 아데노바이러스처럼 심각한 면역반응을 일으키지도 않고, 레트로바이러스처럼 자신의 유전물질을 염색체에 삽입시키는 비율도 매우 낮아 그간의 안전성 우려로부터 자유로웠다. 또한 전달효율이 높고 폭넓은 조직으로 유전자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다.
유전자 전달 치료법은 AAV를 이용한 최초의 치료제인 글리베라(Glybera)를 필두로, 럭스터나(Luxturna)와 졸겐스마(Zolgensma)의 잇단 성공으로 주요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형 혈우병 치료제인 헴제닉스(Hemgenix), A형 혈우병 치료제인 록타비안(Roctavian), DMD 치료제인 엘레디비스(Elevidys)는 모두 AAV 전달 기반의 유전자 보충 치료제다. 현재 AAV 기반 유전자 전달 치료 물질의 임상 건수가 500건 이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시장에 소개될 치료제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AAV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바로 고농도 투여로 인한 간독성과 국소적인 염증반응이다. 특히 AAV에 대해 획득면역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 면역반응의 위험성, 환자 수의 제한, 반복적 투여의 제한 등 문제들이 드러났다. 또한 AAV는 다양한 조직으로의 전달은 가능하지만, 특정 조직으로의 선택적 전달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의학적 문제를 극복하고 AAV 기반의 유전자치료제의 성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AAV의 캡시드를 엔지니어링하여 제한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2) 유전자 편집 치료제
ZFN 기술과 TALEN 기술은 사실상 상업화에 실패하였지만, 크리스퍼(CRISPR)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이로 인한 상업화의 성공으로 향후 유전자 편집 치료제의 부흥이 기대된다. 최초의 치료제인 ‘Casgevy’는 헤모글로빈의 beta-globin 유전자의 이상으로 생겨나는 겸상적혈구 빈혈증과 지중해성 빈혈증의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카스게비는 감마글로빈의 억제유전자인 BCL11A의 인헨서 영역을 제거함으로써 감마글로빈의 발현을 증가시켜, 결핍된 베타글로빈을 대체하는 독특한 기전의 치료 방식을 활용한다. 기전은 약간 상이하지만, BCL11A의 발현량을 줄임으로써 감마글로빈의 발현을 늘린다는 점에서 같은 작용기전을 갖는 경쟁약물이 Editas, Beam Therapeutics 등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카스게비처럼 ex vivo(생체 외) 치료제는 결국 면역세포나 조혈모세포를 표적으로 하기에 다양한 희귀질환의 치료제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in vivo(생체 내) 치료 영역에 많은 희귀 유전질환이 존재한다. 아직 승인된 사례가 없지만 Intellia Therapeutics의 ATTR 치료제인 NTLA-2001이 가장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혈액 내 TTR 단백질의 혈중농도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단회 투여로 영구적인 치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돼, RNA 기반 경쟁 약물에 비해 환자의 편의성 및 효과성에서 우월하다. 이는 향후 2~3년 이내에 FDA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최초의 in vivo 유전자 편집 치료제다. 단일염기교정, 프라임 에디팅(prime editing), CRISPRa/i와 같이 DNA를 절단하지 않고 편집하는 기술들도 임상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AAV 전달을 위해 소형화된 유전자가위 기술로 다양한 in vivo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주요한 축이다.
3) 유전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는 단연 CAR-T 치료제(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 Therapy) 분야다. 이 치료법은 환자로부터 T세포를 추출한 후 암표적 항원 인식 부위와 막통과 부위, 신호전달 부위로 구성된 CAR 유전자를 도입하여 혈액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노바티스의 킴리아(Kymriah), 카이트/길리아드의 예스카타(Yescarta), 셀젠/BMS의 아벡마(Abecma) 등이 혈액암 기반의 치료제로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CAR-T 치료제의 탁월한 암 살상 효과 이면에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과 최근 불거진 발암 가능성과 같이 안전성의 이슈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관련 규제의 허들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자가유래 T세포를 이용해야 하므로 고도의 생산시설, 높은 약가 비용, 환자의 불편 등과 관련된 제한점이 있다. 아직 치료 대상이 혈액암에 머물러있다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동종 유래 세포 기반의 CAR-NK(Natrual Killer) 치료제가 부상하고 있다. 현재 혈액암에 국한된 질환을 고형암으로 확대하려는 쪽이 가장 큰 동력을 보이는 분야다.
면역세포에 주입되는 CAR의 엔지니어링도 하나의 치료제 개발 축이다. 최근 개발된 3, 4세대 CAR를 적용한 차세대 CAR-T 치료제가 임상에서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게 될지는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다. CAR-T 치료제의 가장 큰 제약사항은 자가유래 기반의 T세포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대량생산이 제한되며, 환자가 불편을 느끼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자 면역 거부에 관여하는 MHC 유전자나 TCR 유전자를 유전자가위로 제거한 동종 CAR-T 치료제의 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CAR-T가 혈액암에서 큰 치료적 성공을 보았듯, CAR 기반의 면역세포 치료제가 다양한 희귀암을 치료하려는 움직임 또한 유효해 보인다.
유전자치료 산업화에서의 도전과제
최근 유전자 전달체 개발이 다각도에서 시도되고 있어 향후 유전자치료제 시장은 긍정적일 전망이다. AAV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아데노바이러스, 헤르페스바이러스 등을 이용한 치료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고, Virus-like Particle(VLP) 기반의 전달체 또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렌티바이러스 기반의 Skysona와 Zynteglo가 ex vivo 방식의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일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다만 안전성의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비바이러스성 전달체 영역에서는 LNP의 개량을 통해 간 외에 다양한 조직으로의 전달이 시도되고 있다. 유사 폴리머 기반 전달체들도 각각의 전달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를 노리고 있다. 엑소좀과 같은 생체물질 기반의 전달체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어 성공 사례가 나오면 유전자치료의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 전달 치료제는 특정 유전질환 환자의 많은 수를 커버할 수 있지만, 치료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다. 유전자 편집 치료제는 영구적일 수 있으나 유전 환자의 일부만을 치료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모든 유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영구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인 ‘유전자 삽입(gene integration) 기술’의 개발이 기대되는 이유다. 현재 유수 저널에 몇몇 기술이 소개되어 연구 단계에 있다. 낮은 효율과 비표적 삽입으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희귀질환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치료제는 승인 후에도 장기추적을 요한다. AAV 유전자 보충 치료제의 경우에도 최근 AAV 페이로드의 염색체 삽입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어 장기추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전자 편집 치료의 경우는 최소 15년의 추적관찰을 규정하고 있다. 임상 과정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였던 유전자치료제의 장기추적 결과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유전자치료제는 향후 보다 다양한 치료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희귀의약품은 날이 갈수록 최고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약값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향후 희귀의약품의 저변화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자에게 충분한 유인책이 되면서 환자에게도 지불 가능(Affordable)한 치료법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발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유전자치료 산업의 전망과 전략
제약시장의 무게중심이 기존의 합성신약 중심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옮겨지고, 바이오의약품도 재조합 단백질과 항체를 거쳐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전체 의약품의 연간 성장률은 3~6%에 그치지만, 유전자치료제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030년까지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향후 치료제 산업을 유전자치료제가 견인하게 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심에는 유전자 전달 치료제, 유전자 편집 치료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있다. 유전자치료제는 기존의 약물들과 달리 다양한 기술들의 접목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전자치료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충분한 경험치가 축적된다면 현재 희귀 난치질환에 적용되고 있는 적응증의 한계를 넘어 대사질환 및 다양한 퇴행성 질환, 노화의 영역까지 치료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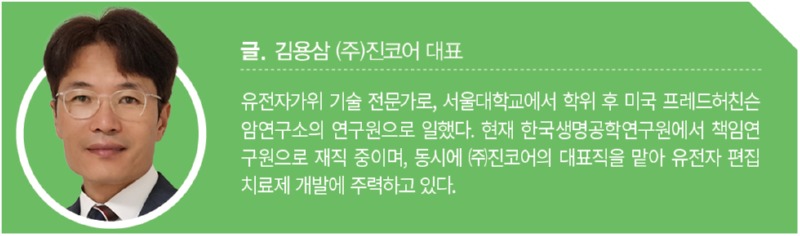
- Vol.465
24년 05/06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