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AL ISSUE Intro 바이오경제를 이끌 첨단바이오
덴마크 기업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개발한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는 ‘기적의 약이 덴마크 경제에 기적을 가져다주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이언스는 위고비를 포함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를 기반으로 하는 비만치료제를 ‘2023년 올해의 성과(2023 Breakthrough of The Year)’로 선정하였다.01 이처럼 첨단바이오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며 바이오경제를 선도할 수도 있다.
생명공학 기술
한편 생명공학(Biotechnolgy, BT)이라는 용어는 헝가리 과학자 Karl Ereky가 1919년에 출간한 저서(Biotechnologie der Fleisch-, Fett-, und Milcherzeugung im Landwirtschaftlichen Grossbetriebe: für Naturwissenschaftlich Gebildete Landwirte Verfasst(대규모 농장에서 육류, 지방 및 우유 생산의 생명공학))에서 유래되었다(Fari and Kralovanszky, 200602).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기술은 기반 기술로서 타 분야와 접목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등과 융합하여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와 같이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에는 정부도 활발하게 투자하여, 2020년에는 정부 투자 금액이 4조 원 이상에 달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기반 기술의 발전과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바이오·제약기업의 기술수출 규모 확대도 확인되었다. 동시에 바이오 분야의 인력양성 확대와 더불어 관련 분야의 특허 및 논문도 증대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생명공학 기술은 최근 맥킨지&컴퍼니의 보고서(바이오 혁명, https://www.mckinsey.com/)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다양한 산업 분야(보건, 농업, 식료품, 소비재·서비스, 소재·에너지 등)에 적용되고 있다. 향후 인류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공학은 다양한 산업 분야(레드, 그린, 화이트)에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대상 생물체(미생물, 동물, 식물, 인체 등)에 적용하여 인류가 당면한 문제(기후변화, 식량, 환경, 에너지 등)의 완화 및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이다. 또한 바이오 기술은 디지털 및 정보 기술과 융합하여 생산과 소비는 물론 사회의 변화를 일으켜 바이오경제(Bioeconomy) 시대에 이를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써의 첨단바이오

최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경제 안보에 기여할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그림 1).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구도를 고려하여 경제·외교·안보적으로 전략적 가치를 종합하고, 산업경쟁력·공급망 등 경제 안보상 국익을 좌우할 수 있는 기술, 급격한 시장 성장,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 혁신 기술, 국가안보로의 활용성이 높고 국가 간 수출통제로 자립이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2023년 9월)을 통해 국가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각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중점분야는 관계부처의 실무협의 및 기술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통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글로벌 신산업경쟁력 및 공급망 내 높은 중요성, 신산업 파급효과 및 외교·안보적 가치, 임무 지향적 기술개발 및 5~10년 내 성과 창출 가능성을 원칙으로 선정되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바이오 분야에는 4가지의 중점기술(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감염병 백신·치료, 디지털 헬스 데이터 분석·활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4가지 중점기술은 미래 도전 및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생명공학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다. 합성생물학은 공학적 관점에서 생물학을 해석하고 설계하여 공학 생물학이라고도 하며, 생명체의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이다. 감염병 백신·치료 분야는 신변종 감염병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치료제의 개발과 감염병의 진단 및 예측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한다.
유전자·세포치료 분야는 질병의 질환 극복을 위해 유전자 및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생산하는 영역이다.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은 유전체 정보를 포함한 다중 오믹스 데이터, 환자의 임상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분석하여, 사회 구성원의 건강관리와 질환의 전주기 관리에 활용하는 분야다. 더불어 노화 관련 연구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가 예상되기에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다. 이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첨단바이오 연구개발 성과가 적용될 수 있는 연구 분야다.
첨단바이오 분야 고도화를 위한 바이오 규제 선진화
바이오 분야의 규제 관련 이슈는 연구개발 및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및 선진화가 필요하다. 바이오 분야의 규제는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여, 문제의 심각성 및 개선의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03
글로벌 기준과 차이가 있는 국내의 규제도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조사되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04을 구성하고,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검토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8월 출범 이후 다양한 개선 사례가 제시되고 있는데, 바이오 분야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2023년 2월) 및 신의료 기술평가 제도(2023년 12월)에서 개선이 있었다(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 참고).
또한 정부는 2023년 2월에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하였다. 기술 발전 및 시장 성장 대응과 선제적 규제개선을 방향으로 하여,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6대 핵심기술(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9월에 설립된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05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 추적조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종합정보/기술을 지원하고있다. 2022년 1월에는 국민 보건 향상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가 설립되어 규제과학 인재 양성, 허가심사 인력 역량 강화, 규제과학 연구 및 정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06

첨단바이오 분야 산업을 위한 인재 육성
첨단바이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바이오와 디지털이 융합되는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바이오 분야 계약학과는 2023년 기준 약 40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교육부는 계약학과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계약정원제07를 도입하여, 산업 수요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학과의 설치 요건(설치권역, 수업 운영 방식 등)을 완화하였으며, 계약정원제의 경우 계약학과의 설치 없이 기업 맞춤 교육이 가능하게 해 필요 우수 인력의 수급 방안으로 고려된다. 또한 국내 바이오 생산시설이 증대되면서 생산 인력의 증대도 필요해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GMP 수준의 한국형 NIBRT(K-NIBRT08)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신 경쟁과 경제동맹의 개념이 기술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일본 및 중국 등 전 세계적 기술패권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바이오 분야는 국민의 건강안보와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분야다. 첨단바이오 분야의 산·학·연·병 융합 및 기술 분야의 융합을 통해 기술패권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첨단바이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의 적용을 통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정부·대학·연구기관·병원·산업체 등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현시점에서, 첨단바이오 분야의 4개 세부 분야(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치료 분야, 유전자·세포치료 분야,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와 더불어 노화 과학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01 https://www.science.org/content/article/breakthrough-of-theyear-2023
02 Fari MG, Kralovanszky UP (2006) The founding father of biotechnology: Karoly (Karl) Ereky. Int J Hort Sci 12: 9-12
03 바이오 최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통찰과 전망. 2024. 임정빈(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2022-76)
04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 (https://foryou.better.go.kr/base/main/view)
05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https://ltfu.mfds.go.kr/main.do)
06 한국규제과학센터 (http://k-rsc.or.kr/main.php)
07 교육부, 보도자료 (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23년 5월 24일)
08 K-NIBRT 사업단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http://knibrt.com/main/main.p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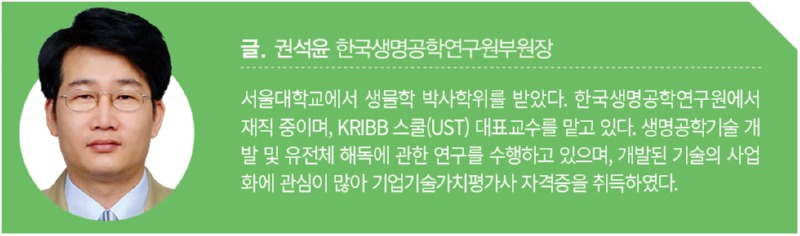
- Vol.465
24년 05/06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