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AI 시대, 다시 써야 할 기술경영 교과서
무엇이 대(大)전환인가
연속성(Continuity)과 불연속성(Discontinuity), 그 차이는 간단하다. 연속성의 시대에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따라가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 통할 수 있다. 불연속성의 시대에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절벽에 떨어지고 만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살 수 있다. 이른바 VUCA[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라는 축약어가 이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복잡성(Complexity)’이다. 복잡함에 숨어있는 질서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복잡성 개념의 핵심이다. 누가 먼저 새로운 질서를 맞추고 적응할 것인가? 여기서 생(生)과 사(死)가 갈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대전환이 소전환과 다른 것은, 한마디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소전환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대전환에서 누가 살아남을까? 답은 명확하다. 생존의 기회를 잡으려면 ‘변종(Variant)’이 많이 나올수록 좋다. 변종은 곧 ‘돌연변이(Mutation)’다. 지금은 ‘비상식’이지만 미래의 ‘상식’을 향한 시도가 많이 일어날수록 유리한, 곧 ‘다양성(Diversity)’이 생존의 키(Key)라는 얘기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AI 게임 체인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데는 더 이상 이견이 없다.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갖가지 시나리오가 난무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다. 18세기 ‘자본주의’가 등장할 때도 그랬지만, ‘창조적 파괴’냐(낙관론), ‘파괴적 창조’냐(비관론) 하는 논쟁은 늘 창조적 파괴의 승리로 끝났다. AI도 마찬가지다. 창조적 파괴가 될지, 파괴적 창조가 될지는 인간에게 달렸다. 인류의 역사는 말해준다. 거대한 게임 체인지가 일어날 때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자는 역사의 승자였고, 거역하는 자는 역사의 패자였다.
AI가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다. 비전(Vision) 등 분석형 AI는 이미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상 ‘생산성의 언덕’을 넘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분석형 AI의 뒤를 이어 등장한 초거대·생성형 AI는 새로운 ‘기대의 정점’에 올라선 형국이다. 기대와 현실의 가장 큰 간극(Gap)에 섰다는 것은 지금부터가 진검승부라는 점, 그리고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먼저 줄이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시기가 역풍(Headwinds)도 가장 강하게 분다는 점이다. 초거대·생성형 AI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갖가지 ‘리스크’가 그것이다. 다시 우리는 본질적 질문 앞에 서야 한다. 혁신이냐? 역풍이냐? 이 선택지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베팅할 것인가?
AI 학자들이 말하는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GPT(General Purpose Technology)가 된다면, 그것은 곧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의 시대, 곧 새로운 산업혁명이다. 혁명은 ‘부(富)의 이동’이다. 부를 창출하는 개인, 기업, 산업, 국가가 달라진다. 한마디로 세상이 통째로 뒤집힌다. 기존의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할 AI 시대다. 왜냐하면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상식 중 99%는 다 거짓말’이라는 책이 잘 팔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게임 체인지’는 다르게 표현하면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AI 게임 체인지의 임팩트(Impact)는 역사상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AI가 바꾸는 기술경영 교과서
AI를 상징하는 GPT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래의 기술경영 이론을 뒤흔들고 있다. 아니, 기술경영 교과서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할 판이다. 사례를 통해 몇 가지 가설적 추론을 제기해 본다.
1) ‘생산성의 역설’이냐, 측정의 한계냐
당장 AI 시대의 생산성이나 성장 측정부터 도전에 직면했다. 지금의 생산성, 성장 회계는 20세기 초 산업화 시대에나 통용되는 것이다. AI 등 디지털 투자를 하는데도 기대하는 생산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른바 ‘생산성 역설(Productivity)’은 규제 등 구조적 장벽(Hurdle) 탓도 있지만, 측정의 한계도 있다. 이런 주장은 AI 시대에 맞는 생산성, 성장 지표를 개발하면 기업 경영, 국가 경제의 성과 비교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로 이어진다.
2) 기술혁신이냐, 기술확산이냐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변수는 ‘기술 수용성’이다. 주목할 것은 발명 및 발견의 상업화로 정의되는 기술혁신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으로 이어지는 기술확산은 중국이 주도하는 양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중국 14억 인구의 AI 신뢰도(AI-friendly Attitude Index)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영국 미디어 Tortoise 비교). 미국은 중국의 기술확산을 ‘디지털 레닌주의’라고 비판하지만, 게임 체인지는 발명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 확산으로 완성된다. 미·중 충돌이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대목이다.
3) ‘R&D’에서 ‘Fast R&D’로
전통적인 R&D 개념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R&D 앞에 Fast(빠른)가 붙은 ‘Fast R&D’가 AI로 가능해지면서 경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R&D에 ‘속도(Speed)’가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이다. 누가 시간 변수에서 앞서가느냐가 승패를 가를 공산이 크다.
4) 혁신 주체의 다변화·민주화
산·학·연이라는 도식화된 혁신 주체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다. 챗GPT의 오픈AI는 기업 펀드를 받는 민간비영리재단(Private Non-profit) 소속이다. 언제든 스타트업으로 둔갑할 수 있는 개인 개발자는 그 자체로 중요한 혁신 주체다. 이른바 ‘빅테크’는 ‘빅자본’이라고 할 정도로 기술 투자의 큰 손으로 부상했다. 크게 보면 기업이 주도하는 AI 시대다. 이제 산·학·연은 고전적인 협력의 한 형태일 뿐이다. AI 시대 떠오르는 혁신 주체로 개인과 민간비영리재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혁신 형태와 패턴의 교체
AI는 제품혁신인가? 공정혁신인가?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는 제품혁신, 공정혁신이 아니라 데이터 혁신, 알고리즘 혁신, 대화형 혁신, 생성형 혁신이 지배할 것이다. 플랫폼 혁신도 AI 에이전트(AI Agent) 혁신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혁신이라고 하면 그동안 ‘생산자 혁신’이 주류였지만, 모든 분야에서 AI로 무장한 ‘사용자 혁신’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이다.
6) AI 시대 표준전쟁, 다극화 가능성
‘표준전쟁’은 이론적으로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이 가능하다. 하지만 AI는 정부 규제 가능성과 함께, 국가 안보를 고려하는 각국의 국익 계산 변수가 작용하여 승자독식 이론이 현실이 되기는 어렵다. 특히 미·중 충돌은 글로벌 표준이 어느 일방으로 흐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여기에 초거대·생성형 AI를 놓고 폐쇄형(Closed) 진영(오픈AI)과 개방형(Open Source) 진영(메타)이 대립하고, 구글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양상도 중대 변수다. 후발국과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립과 충돌이 계속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AI와 다양성 측면에서 새로운 혁신 공간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7) ‘Try Many, Fail Fast’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많이 나오는 사회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유리하다. 누군가는 ‘많은 시도, 빠른 실패(Try Many, Fail Fast)’를 해줘야 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타트업이다.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시대로 보이지만, AI 혁신 생태계에서 진짜 중요한 플레이어는 죽음을 불사하고 기꺼이 퍼스트 무버로 나서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다. 대기업은 그 특성상 '많은 시도, 빠른 실패'가 어렵다. 한편, '많은 시도, 빠른 실패'를 위해 더없이 좋은 무대는 시장이다. 스타트업은 시장 진입의 자유도가 높은 나라로 몰릴 것이다.
8) 새로운 Collabo 등장
단독(Solo)이냐, 손잡기(Collabo)냐. 손잡기를 한다면 무엇이 최적인가. 전략적 동맹(Strategic Alliances), 조인트벤처, 라이센싱-인, 라이센싱-아웃, 공동연구 컨소시엄 등 기존의 손잡기 유형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다. AI 시대에 주목할 손잡기 유형은 MS와 오픈AI의 케이스로, 빅테크와 비영리재단 스타트업 간의 딜(Deal)이다. MS는 밖에서 펀드를 투자하여, 사내 기술개발 실패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최초로 시장에 진입하는 테스트 리스크도 피해 갈 수 있었다. 그리고 기술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후에야, MS는 이를 자사 비즈니스 모델에 전사적으로 채택하는 전략을 선보였다. 오픈AI는 오픈AI대로 자금 조달 리스크 없이 우수한 인재를 마음껏 끌어모아 베팅할 수 있었다.
9) 생성형 AI와 저작권
생성형 AI를 기존의 저작권 제도에 따라 재단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저작권을 생성형 AI의 흐름에 맞게 개혁할 것인가? AI가 촉발한 이 문제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생성형 AI의 활용을 막을 수 없다면, 저작권의 ‘시장 차별화(Market Segmentation)’ 가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문제는 누가 이 제도개혁의 총대를 멜 것이냐다.
10) ‘창조성’은 인간만의 영역인가?
‘창조성(Creativity)’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전에 없던 결합 창조(Combinatorial Creation Like Never Before)’, ‘탐색을 통한 창조(Exploratory Creation by Expanding Search Space)’, ‘새로운 개념 창조(Conceptual Creation by Opening a New Definition Space)’가 그것이다(Margaret Voden). AI가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창조성 중, 앞의 두 가지 유형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창조성을 위한 AI와 인간의 새로운 분업과 협력이 요구된다.
11) 초거대·생성형 AI 이후 ‘넥스트 R&D’
초거대·생성형 AI 모델은 ‘할루시네이션(주어진 데이터 또는 맥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것)’ 등 극복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러 가지 보완책이 동원되고 있지만 그런 차원을 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모델 구조나 학습 방법 등 근본적 대안 연구가 그것이다. 글로벌 어디에선가 진행되고 있을 ‘넥스트 R&D’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직접 도전할 생각이 있는가?
12) Local이냐, Global이냐
AI와 다양성 이슈는 중요하다. 각국에서 말하는 AI 주권 니즈도 변수다. 결국 승부는 로컬이냐 글로벌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로컬을 위한 글로벌(Global for Local)’, ‘글로벌을 위한 로컬(Local for Global)’에서 누가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될 것이다. 또한 AI는 언어장벽을 급격히 붕괴시키고 있다. 국가 간, 문화 간 콘텐츠 융합이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화, 로컬화를 이끌 것이다. AI 시대 모든 기업은 콘텐츠 기업이 된다.
13) 규제개혁이냐, 기업의 ‘내부 규범’이냐
규제개혁은 어느 나라에서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AI 시대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시간이 걸리는 규제개혁 대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기업들의 ‘내부 규범(Internal Norm)’을 촉진하는 것은 어떠한가? 승자 기업의 내부 규범을 미래의 규제 바로미터로 삼는다면, 기술과 제도 간 공진화의 시차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게 가능해지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그 사회의 기업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14) 기술 장벽이냐, 자본 장벽이냐
초거대·생성형 AI 모델의 내부 개발자들은 하나같이 ‘규모의 법칙(Scaling Laws)’을 강조한다. 규모의 법칙은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본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 후자에서 희비가 엇갈린다면 후발주자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금융은 미국과 중국이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다.
15) 성능이냐, 비용이냐
AI 성능 경쟁이 뜨겁다. 그러나 진화는 결코 한 쪽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비용(에너지)이라는 또 다른 진화의 축이 있다. 인간이 사족보행에서 이족보행으로 진화한 데에는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멀리 나가 먹이를 구하려는 니즈를 빼놓을 수 없다. AI에 소요되는 엄청난 계산과 이에 따른 에너지 문제는 AI 반도체 경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AI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탄소중립,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느냐도 AI 시대 기술경영의 중대 과제다.
선택지는 무엇인가?: ‘도주론(逃走論)의 기술경영’
대전환이 일어나면 가진 것이 많을수록 불리하다. 쉽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도, 국가도 망하는 이유가 단점보다 장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분석이 의미심장하게 와닿는 시기도 바로 대전환 때다. 늘 지켜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이른바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이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핵심 경직성(Core Rigidity)’으로 둔갑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사라진다. 사라지고 싶지 않다면 선택지는 단 하나다. 일본의 아사다 아키라의 ‘도주론’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장 도망가야 한다.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만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말이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도망의 진짜 의미는 변화를 위한 대(大)이동이다. 다른 말로 하면 AI로 무장하는 대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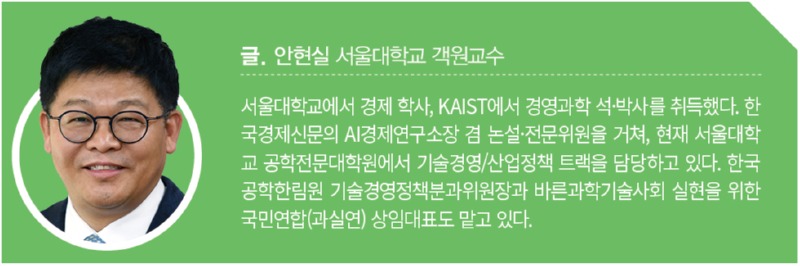
- Vol.465
24년 05/06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