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피할 수 없는 ‘기술의 지경학(Geo-economics)’
경제 안보를 위한 ‘Power Economics’
“Are You Robust Enough?” 이 질문은 개인· 기업·국가에 모두 해당한다. 환경의 위험이 달라지면 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극복 전략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관련하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에 실린 ‘기업 생존의 생물학(The Biology of Corporate Survival)’ 논문은 기업 환경을 복잡계(complexity)로 전제하고 세 가지 위험과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 위험은 ‘갑작스러운 붕괴 위험(collapse risk)’이다. 산업 안팎에서 일어난 변화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졸지에 구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 아이디어, 혁신 등과 관련하여 ‘다양성(diversity)’을 추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응 방도가 없다. ‘동질성(homogeneity)’이 아니라 ‘이질성(heterogeneity)’ 이 생존 조건이 된다는 말이다.
두 번째 위험은 ‘도미노 전염성 위험(contagion risk)’이다. 이는 경제나 비즈니스 생태계 중 어느 한 부분에 가해진 쇼크가 급속도로 다른 부분으로 퍼져나가는 경우다. 이에 대응하려면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간, 그리고 비즈니스 시스템 간 언제든 끊어낼 수 있는 느슨한 관계를 맺거나 요소·시스템 간 차단막을 상비해야 한다.
세 번째 위험은 ‘드물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이 되는 위험(fat-tail risk)’이다. 자연재해, 테러,정치적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기업의 사업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마다 ‘완충 능력(buffering capacity)’을 준비하는 ‘복제(duplication)’, 이른바 ‘예비력(redundancy)’을 갖추어 대응해야 한다.
훗날 역사는 변동성과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모호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부카(VUCA, Volati lity·Uncertainty·Complexity·Ambiguity)’로 불리는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까?

1) 지정학과 지경학 7개 조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일본 아사히 신문 주필은 지금의 시대를 고찰하면서 ‘지정학(地政學)’ 개념을 다시 소환했다. 지정학이란 땅의 지도를 펼쳐놓고 군사를 무기로 상대국을 지배하는 등, 군사력을 이용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이다.
후나바시 주필이 말하는 지정학 7개 조는 다음과 같다. ①세계의 구성단위는 ‘자기 보존’이 최우선인 국가다. 따라서 세계는 본래 ‘무정부 상태(anarchy)’ 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한다. ②평화를 위해서는 ‘세력 균형’과 ‘국제질서의 정당성’이 요구된다. ③평화를 유지하려면 ‘억지력’이 필요하다. ④당장 해결(solve)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상황을 관리하면서(resolve) ‘때’를 기다려야 한다. ⑤국가 생존이 걸린 일이면 힘(power)이 부(wealth) 위에 있게 되고, 안보가 국익보다 중요해진다. ⑥전략은 통치를 넘어설 수 없다. 통치의 요체는 정치 지도력(리더십)이다. ⑦역사는 ‘국가(states)의 기억’이다. 국가는 역사로부터 학습한다.
무엇이 느껴지는가. 지금의 국제질서를 보면 무정부 상태, 약육강식의 세계와 다를 바 없다. 군사만이 무기가 아니다. ‘지경학(Geo-economics)’에서는 땅의 지도를 펼쳐놓고 경제를 무기로 상대국을 지배하는 등, 경제력을 이용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군사에서 경제로, 싸움의 도구(무기)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후나바시 주필이 말하는 지경학 7개 조도 있다. 우리 관점에서 쉽게 풀어헤치면 다음과 같다. ①국가는 ‘경제 안보 흑자국’과 ‘경제 안보 적자국’으로 나뉜다. 한국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②경제 안보 적자국에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법의 지배에 기초한 규범(rule),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이 장기적인 안전망이 된다. ③(그러나)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반드시 평화를 약속해 주지는 않는다. 상호의존도의 불균형은 힘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무기가 된다(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등). ④경제 안보는 국산(國産)주의·일국(一國)주의로는 보장할 수 없다. 동맹국·동지국·우호국과의 연대가 요구된다. ⑤경제 안보는 가장 취약한 고리의 강도 이상으로 강해질 수 없다. ⑥경제 안보를 지키려면 차세대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앞서가는 게 필수적이다. ⑦경제 안보는 ‘전략적 자율성(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과 ‘전략적 불가결성(우리가 공급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전략자산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 기둥이 핵심이다.
지경학은 곧 경제 안보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지금의 글로벌 경제환경이 이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안보 대전환: ‘모든 것이 무기다’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면서 ‘power economics(힘의 경제학)’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 용어는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게 되면서 다시 살아났다. 지경학, 경제 안보, 힘의 경제학은 그 본질이 똑같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인공지능(AI)이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안보 대전환(Security Transformation, SX)’이라고 기록할지 모른다. 최소한 DX, GX, SX의 ‘3가지 대전환(Triple Transformations)’이라고 해야 할 판국이다.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두 가지 중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국가 국방전략’과 ‘국가 안보 전략’이 그것이다. 국방에서 경제로, 경제에서 기술로 대(對)중국 공격 무기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국방, 경제, 그리고 기술의 복합 전략 완성이었다. 2018년 7월에는 드디어 미국의 대중 공격이 개시됐다. 출발은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명분이었다.
모든 것이 무기다. 군사는 물론 경제, 경제 중에서도 기술이 무기화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대전환도 경제 안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로서의 한국과 한국 기업은 이 유례없는 엄혹한 경제 안보 환경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미·중 충돌 100년 간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주도 자본주의는 엄청난 쇼크로 허우적거렸다. 반면 중국이라는 버팀목은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미국과 중국의 이 대조적인 장면은 그 후 치열한 미·중 충돌의 예고탄과 다름없었다. 두 나라 간의 충돌이 본격화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까? 한 가지 단서는 20세기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살펴보면, 미·소 대결은 지난 세기 전체에 걸쳐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미·중 충돌 역시 21세기 전체를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
이 충돌이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군사비 지출 중, 미국은 가장 큰 비중인 37%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비중이 큰 국가는 12%의 중국으로, 미국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으로 눈을 돌리면 미국은 전 세계의 25%, 중국은 18%를 차지하고 있어 그 차이가 줄어든다. 2022년 기준 연구·개발 투자 지출을 보면 그 격차는 더욱 줄어든다. 미국의 비중은 전 세계의 30%이고 중국이 25%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보통 연구·개발 투자는 GDP로, GDP는 군사비 지출로 이어진다. 따라서 미국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추격의 고삐를 당길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쫓고 쫓기는 패권 다툼이 결코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이유다.
돌아온 산업정책 = f(기술·경제·안보)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충돌 속에 주목받는 것이 있다. 바로 산업정책의 화려한 귀환이다. 산업정책은 ‘유치산업보호론’에서 시작해 ‘숨겨진 산업정책론’, ‘경제안보론’, ‘전략적 무역정책론’ 등으로 변천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 산업정책의 주류는 무엇일까. 현재는 ‘임무(미션) 지향 혁신정책론(1·2·3세대)’, ‘혁신기반 경제안보론(미국)’, ‘기술주권론(EU)’ 등이 혼합되고 있다. 산업정책이 기술+경제+안보의 하이브리드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기존의 교과서를 다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경제 안보 시대에 ‘혁신’이란어떤 의미를 지닐까. 경쟁국(또는 경쟁국 기업)이 먼저 기술을 개발하거나 상용화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경제 안보 위협이 된다. 외부로부터 경제 안보 위협을 초래한 정치는 실패한 정치다. 그렇기에 ‘혁신의 정치학’이 주목받고 있다. 시시각각 가해지는 ‘외부 위협’과 구질서와 신질서 간 ‘내부 갈등’의 함수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의 ‘혁신율’과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가 정치의 핵심 어젠다가 되고 있다.
국가는 왜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가.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곧 국가 생존의 문제다. 남도 알고 나도 아는 이정표(Road Map)에 언제까지 갇혀있을 수는 없다.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로드맵이 있다면 그것은 곧 치명적인 위기가 된다.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로드맵이 있다면 그것은 나만의 전략자산이 된다. 따라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로드맵에서 먼저 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다. 바야흐로 연구·개발 투자가 ‘속도의 전쟁’이 되고 있다.
국가로서 한국의 선택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은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알던 나라들이 아니다. 강대국이라지만 ‘룰(rule)’이 아니라 ‘힘(power)’으로 상대국을 통제하려는, 이른바 ‘강대국 실격(失格) 시대’를 주도하는 나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양다리를 걸치는 ‘전략적 모호성’은 위험하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을 택하는 ‘전략적 명료성’은 우리의 독자 공간을 스스로 좁히는 더 위험한 선택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다른 선택지는 없는가. 세상은 이분법이 아니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탈(脫) 구축(Deconstruction)’을 외쳤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강대국 사이의 ‘버퍼 존(buffer zone; 완충지대)’이 한국이다. 따라서 전쟁 위험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지만, 한국은 지경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의 ‘기술 존(tech zone)’이 될 수 있다. 미국도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기술적 억지력’을 확보하면 한국의 독자적 공간을 넓혀갈 수 있다. 한국이 가야 할 길은 ‘전략적 모호성’도 ‘전략적 명료성’도 아닌, ‘전략적 존재성’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국이 ‘전략적 존재성’을 가진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은 후나바시 주필이 제시한 ‘지경학 7개 조’의 마지막 조에 있다. 바로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 과, 한국이 공급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적 불가결성’이 그것이다.
한국 기업의 기술 전략: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을 확보하라
“미국이 반도체를 무기로 중국에 규제를 가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겪는 위기의식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미국의 규제를 받아 회사가 타격을 입을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반도체에 집중하는 기업과 태양광·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회사를 분리해 리스크를 분산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보면) 자유무역이란 개념도 희미해지는 것 같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잘 풀어나가길 기대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고객사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다른 국가에서 기술을 무기화한다 해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독보적 기술을 갖춘 기업이 탄생해야 한다. 특정 국가가 언제 어떻게 필수 소재·장비의 공급을 중단할지 알 수 없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일본이 소재 수출을 제한해 난감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필자가 앞서 논의한 바와 일맥상통하게,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은 리스크를 줄여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또한 기술 무기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독보적 기술을 갖춘다는 것은 ‘전략적 불가결성’을 확보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 강국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경제 안보 위험 시대에 기술기업이 갖춰야 할 두 가지 키워드는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이다. 이것은 반도체 업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산업, 모든 기업이 앞으로 100년 넘게 지속될지 모를 기나긴 기술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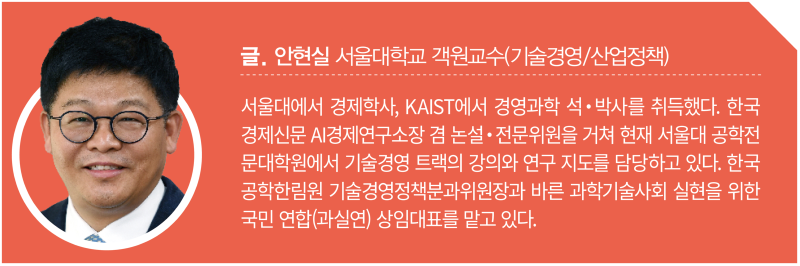
- Vol.467
24년 09/10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