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al Issue 02 중국 서비스 로봇 산업의 동향과 시사점
중국 서비스 로봇 기업의 부상
산업용 로봇 시장과 달리,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로봇 기업들은 오랫동안 후발 주자로 치부되었지만, 일부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과 편리한 사용성,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치를 내세워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고성장한 중국의 서비스 로봇 기업들은 선발 주자이던 선진국 기업들을 추월하거나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선발 기업들을 넘어섰다. 2001년 등장한 세계 최초의 로봇 청소기 트릴로바이트(Trilobite)는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Electrolux) 제품이었다. 본격적인 시장화는 2002년 미국 아이로봇(iRobot)의 룸바(Roomba) 출시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국내 기업들도 시장에 진입했다. 그런데 지금은 로보락(Roborock, 北京石頭世紀科技有限公司), 에코백스(Ecovacs Robotics, 科沃斯)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4년 2분기에 로보락이 사상 최초로 아이로봇을 제치고 글로벌 1위 기업(출하량 기준)으로 등극했다. 상위 10위 기업 중 미국의 아이로봇을 제외한 9개 기업은 중국 기업이거나 중국계 투자자가 대주주인 기업들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 로봇 청소기의 존재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 2020년 한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국내에 본격 진출한 로보락은 불과 3년 만에 국내 시장 1위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진출 첫해 약 290억 원이던 로보락의 매출은 진출 4년째인 2023년에는 약 2,000억 원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 로보락은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의 약 50%, 하이엔드 제품(가격 150만 원 이상)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서빙 로봇과 물류용 운반 로봇은 중국 기업들이 시장 개화와 성장에 크게 일조하는 영역이다. 서빙 로봇은 AGV(Automated Guided Vehicle), AMR(Autonomous Mobile Robot)의 개발 초기부터 촉망받던 분야였다. 그런데 시장 창출과 성장을 주도한 것은 미국, 일본 등 로봇 선진국의 기업이 아니라 푸두 로보틱스(Pudu Robotics, 普渡科技), 키논로보틱스(Keenon Robotics, 擎朗智能)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었다. 매년 로봇 시장을 조사해 온 일본 후지경제가 서빙 로봇의 시장 규모를 본격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당시, 이미 중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물류용 AGV 시장에서는 설립 10년 차인 중국의 긱플러스(Geek+, 北京极智嘉科技股份有限公司)가 10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스위스의 스위스로그(Swisslog), 미국의 데마틱(Dematic)과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했다.
그림 1 Geek+의 AGV P800, X1200과 Four-way Shuttle ASRS 솔루션을 도입한 중국의 지리자동차(Geely Auto Group)

<https://blog.geekplus.com/company/news-center/geely_ automotive_jdlogistics_geekplus>
차세대 유망 영역으로 주목받는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성장이 재연될 조짐이 엿보인다. 중국 기업들이 상용화 경쟁에 대거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휴머노이드 기술의 연구 개발은 보스턴 다이나믹스(Boston Dynamics), 앱트로닉(Apptronik), 어질리티 로보틱스(Agility Robotics) 등 선진국 기업들이 주도해 왔지만, 테슬라(Tesla)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Optimus)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부터는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근래에 등장한 선진국 기업은 피규어AI(FigureAI) 등 소수에 그친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에서는 샤오미(Xiaomi, 小米), 유니트리(Unitree, 宇树科技), 유비텍(UBTECH, 优必选), 애지봇(AGIBOT, 智元机器人), 로봇에라(Robot Era, 星动纪元) 등 많은 기업이 등장했다. 올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WRC(World Robot Conference) 2024에서 중국 기업들이 공개한 휴머노이드가 무려 30여 종에 달했다.
고객이 원하는 가치 발굴에서 시작, SW와 AI로 차별화 추진
고성장한 중국 서비스 로봇 기업들은 선진국 기업들과 비교하여 신기술의 연구 단계에서는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용화 단계에서는 대등하거나 앞서고 있다. 성공한 중국 서비스 로봇 기업들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유사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고객의 니즈를 잘 포착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기술 개발에 앞서 자사 제품의 사용 환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로봇을 사용하여 얻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다음 핵심 가치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조합하여 로봇을 개발했다. 이전에 등장했던 AGV, AMR 기업들은 대부분 공급자 관점에서 신기술 개발을 우선 추진했다. 이후 실내·외 운반, 안내, 보안 등 다양한 용도의 구현 가능성만을 탐색하였기에 자금난에 봉착하거나 상용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긱플러스의 시장 접근 방식은 선발 기업들과 달랐다. 긱플러스의 창업 멤버들은 창업 목표를 물류 로봇의 상용화로 확실하게 정하고 긱플러스를 설립했다. 글로벌 기업에서 얻은 물류 관리 경험에, AGV 키바(Kiva) 인수를 기점으로 아마존(Amazon)이 유발한 물류 자동화 추세를 접목하여 시장 추이를 분석한 결과였다. 긱플러스 창업자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애초 고민하던 사업 후보는 물류 로봇과 산업용 로봇이었다. 약 10년간 ABB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에서 수행했던 물류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물류가 로봇과 AI의 기술 프론티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산업용 로봇은 이미 높아진 표준화 수준과 부품 선택의 제약 때문에 발전 여력이 낮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 기업이 아닌 물류 로봇 기업을 창업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림 2 Geek+의 AGV P800(좌), AGV X1200(우)

<https://www.geekplus.com/robot/x-robot>
로보락과 푸두도 고객이 원하는 특정 가치의 구현에 초점을 두고 설립되었다. 로보락의 창업자는 로봇 청소기가 지닌 풍부한 시장성을 실적으로 연결하려면, 고객의 기대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행 성능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푸두의 경우도 다양한 로봇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가 외식업의 난제인 인력 관리, 즉 숙련된 종업원의 확보와 유지 문제를 서빙 로봇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설립하였다.
그림 3 푸두로보틱스의 다양한 서빙 로봇 모델

<https://www.pudurobotics.com/kr/news/890>
둘째, 고객의 요구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했다.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며 제기한 요구 사항을 반영해 수시로 기존 모델을 업데이트했다. 니즈 변화에 대응한 제품 업그레이드도 실시해서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와 고객 기반 확장이라는 양대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로보락은 고객에게 지속적인 성능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2~3개월 주기의 SW 업데이트를 통해 수년 전에 판매했던 구형 모델의 장애물 회피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레이저로 주변 환경을 스캔하는 라이다(LiDAR)를 이용해 주행 성능을 향상하고, 흡입·물걸레 청소 겸용, 먼지 통 자동 비움, 물걸레 자동 세척 및 건조, 자동 세제 투입 등 신기능을 탑재한 신제품도 주기적으로 선보여 왔다. 신기술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온 것이다. 서빙 로봇 1위 기업인 푸두도 마찬가지다. 푸두는 자율주행 기능, 종업원 및 식당 손님과의 소통을 위한 AI 등 주요 기능을 수시로 업데이트했다. 때로는 수개월 만에 개선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해 왔다.
그림 4 물걸레 세척과 건조, 자동 급·배수 기능을 모두 갖춘 로보락의 올인원 S8 Max Ultra

<https://kr.roborock.com/pages/roborock-s8-maxv-ultra>
셋째, 차별화의 초점을 AI와 SW 솔루션에 두었다. 고성장한 중국의 서비스 로봇 기업들은 HW 중심의 기존 로보틱스 기술에 매몰되지 않았다. 범용화된 HW의 한계를 넘어,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가치를 차별적으로 제공할 방안으로 AI와 SW를 선택했다. 긱플러스는 대량의 로봇들이 고속으로 이동하는 창고 내 작업 환경을 고려해서 다수의 로봇을 집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SW 시뮬레이션과 알고리즘에 주목했다. 그에 맞춰 물류 산업에 대한 지식, HW 중심의 로봇 기술, AI와 SW가 주축이 되는 멀티 관제의 3가지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설정하고 관련 인재의 확보와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그 결과, 당시 로봇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AI 알고리즘 전문가들이 창업 멤버로 합류하였다. 또한 Microsoft와 제휴하여, 로봇들을 제어하는 멀티 관제 시스템과 물류 작업 전반을 통제하는 솔루션 등으로 구성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다.
로보락은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시도를 감행했다. 높은 가격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에만 적용하던 LiDAR 기반 SLAM 기능을 30만 원대의 저가 모델인 샤오미 미지아 모델에 탑재한 것이다. 로보락은 제품 자체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요구 사항과 변화하는 니즈 및 사용 환경의 변화를 더욱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체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했다. 로보락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청소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다양한 상황을 학습하여, 신제품 개발에 반영하였다. 맞춤형 OTA(Over The Air) 및 보안 기능 강화 등의 서비스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보락의 제품이 주요 경쟁사 제품 대비 사용자용 앱 및 자율주행,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CPU 스펙이나 PCB(Printed Circuit Board) 구조 등 HW 측면에서는 다소 열세라고 평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한 로보락의 이력을 고려하면 AI와 SW에 초점을 둔 로보락의 전략이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서비스 로봇 기업의 성공 사례가 주는 시사점
중국 서비스 로봇 기업들의 성공 배경에 선전 지역의 풍부하고 저렴한 제조 인프라 및 부품 공급망, 자국의 방대한 내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중국 기업이 동일한 혜택을 받았지만 일부 기업만 급성장했다는 점은 개별 기업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중국의 서비스 로봇 기업들이 성공하기까지 거쳐온 여정은 우리 한국 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고객의 로봇 도입 목적과 사용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로봇이 제공하려는 가치를 먼저 발굴해야 한다. 중국 서비스 로봇 기업들의 사례는 신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구매할 고객을 찾는 것보다, 고객의 관점에서 관심 있는 이슈를 포착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기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성공은 기존 기술들을 잘 엮어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적극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사용 가치와 지불 가치의 구현에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해 준다.
둘째, AI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차별화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AI는 주변 환경이나 사물의 인식에서부터 기구부 제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에서 차별화의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AI는 사용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이란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통해 차세대 로봇의 성능 향상이라는 선순환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으로도 작용한다. 물론 AI 역량 확보가 모든 산업의 공통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로봇 기업 단독으로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기는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지분 교환 등 다양한 방안을 이용하여 AI 기업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업계 공동으로 전략적인 생태계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 완성도 있는 로봇을 만들려면 다양한 HW, SW, AI 기술들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필요한 제반 기술을 모두 내재화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로봇과 AI 분야에 걸친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고려해 봄 직하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로보락은 AI와 SW 중심의 R&D에 집중 투자하고, 구매나 양산, 물류, 영업 분야의 부족한 역량은 샤오미의 공급망 생태계 참여로 보완하여 성공했다.
로보락과 샤오미의 협력 관계를 한국의 로봇 기업들이 응용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수한 양산 체계와 글로벌 영업망을 갖춘 대기업과 R&D에 집중하는 로봇 스타트업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샤오미와의 협력에 기반하여 시장 선도 기업으로 발전한 로보락 사례를 한국 로봇 기업들이 재연한다면 로봇 업계, 나아가 한국 산업 전반에 큰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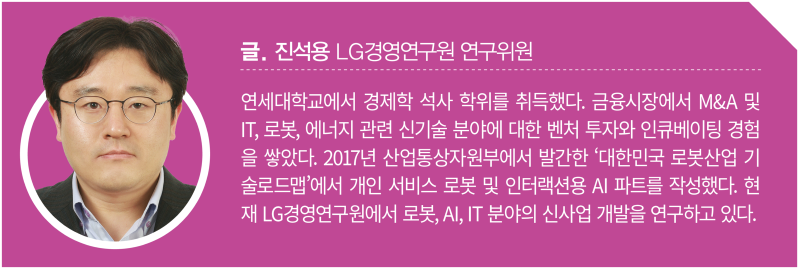
- Vol.468
24년 11/12월호




